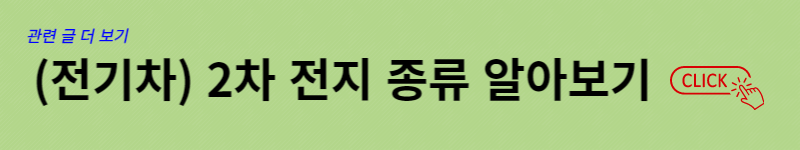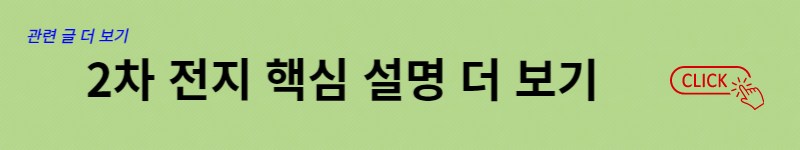앞선 포스팅에서는 2차 전지의 개념, 사용처, 현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핫한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발트 프리 배터리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코발트. 매장량의 60% 이상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의 배터리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년 뒤에는 이 마저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업계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에 주목합니다. 기존 삼원계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빼고 니켈과 망간으로만 구성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인산철을 높인 LFP 배터리 역시 대안책으로 거론됩니다. 특히나 하이 망간 배터리는 리튬과 망간의 비중을 높인 배터리인데 코발트의 안정화 역할을 망간이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의 소실도 거의 없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2023] 전고체,코발트프리, 리튬황...'차세대 배터리' 각축 - 포쓰저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3\'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등 최신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
www.4th.kr
전해질에 대한 고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은 액체로 되어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의 특성상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변하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수 있고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누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 안전한 배터리를 위해서는 전해질에 대한 고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2010년을 도요타를 시작으로 하여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변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양극/음극 사이에 이를 분리해 주는 분리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체전해질을 적용하게 된다면, 분리막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이득이 됩니다. 바로 분리막의 자리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주행 800km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봅니다. 액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높은 화재 위험성을 동반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전해질이 훼손되어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 개발이 까다롭고, 고체 전해질 특성상 전하될 수밖에 없는 전하 이동도, 덴트라이트 현상 등 아직은 기술장벽이 많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종류
고체 전해질로 크게 3가지가 거론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분자계
기존 액체 전해질과 닮아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공정 설계 모두 가장 접근이 용이합니다. 합리적인 제조 원가, 다양한 형태로의 가공이 쉽습니다 하지만 낮은 이온 전도성으로 차를 움직일 만큼의 출력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산화물계
꽤 준수한 이온 전도성을 갖춘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상용화하기엔 공정이 너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분자계와 산화물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황화물계
높은 이온 전도성,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용매와 바인더의 활용이 불가능하고, 황화물계가 수소와 반응하면 황화수소가 만들어져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고체 배터리
소듐 이온 배터리
2021년 7월 중국 최대 배터리사인 CATL이 최초로 반고체 배터리 기반의 소듐 이온 배터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장량이 한정적인 리튬과 달리 바닷속 흔한 물질인 소듐은 리튬처럼 이온화가 되기 쉽다는 점까지 비슷하여 배터리 사용에 용이한 원재료입니다. 풍부한 매장량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고, 화학적으로 리튬의 대체재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듐이 리튬 원자보다는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거워 이동속도가 느린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그러나 고급형이 아닌 저가 모델에는 탑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소듐 이온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LFP 배터리와 하나의 팩 안에 조립하여 사용하자는 제안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소듐 이온 배터리는 아마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보조 역할로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리튬 황 배터리
이론적으로 리튬보다 5배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지구상에 17번째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로 제조 단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황화 리튬이 전해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양극의 황 물질을 손상시켜 문제가 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리튬 에어 배터리
산소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뚫린 다공성 필름을 촉매제로 공기 중에 널리 퍼진 산소를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산소를 양극 물질로 삼으니 음극인 리튬이 배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가볍습니다. 따라서 중량대비 에너지 밀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촉매제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고, 음극 소재는 양극 소재는 기체, 전해질은 액체인 구조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생성될 과산화리튬의 처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음극재
국내 배터리사들은 음극재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보통 흑연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리콘이 핵심소재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의 장점은 흑연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탄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은 리튬을 1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는 4개까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튬을 100개 저장하기 위해서 흑연은 600개가 필요하지만, 실리콘은 25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이즈라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가 높은 용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은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한솔 케미칼, SKC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핫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차 전지 제조 공정 알아보기 (1) | 2023.10.29 |
|---|---|
|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 종류 (0) | 2023.03.15 |
| 2차 전지 간단하게 핵심만 (0) | 2023.03.12 |
| 연료전지와 수소 에너지 (0) | 2023.03.08 |
| 세상을 바꿀 수소에너지 (0) | 2023.03.08 |